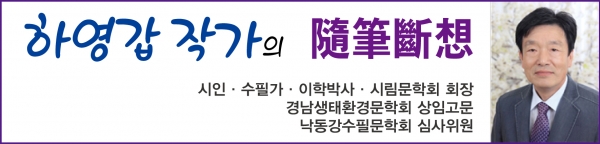
헛불이 아까워 구들방을 만들었다. 마당 옆에 재였던 묵은 나무를 다른 장소에 치우고 그 자리에 아주 작은 방에다 가마솥을 걸고 염료를 끓인다.
1970년대 우리나라 민둥산을 푸르게 만드는데 일조했던 사방사업용 나무 중의 하나.
지난 가을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장군봉 자락에서 간벌과 가지치기로 약간 채취한 산오리나무를 천연염료로 추출하기 위해 불을 지핀다.
땔감으로는 끈질기게 움이 나 붙어 다니는 코로나 사촌 찔레가시덩굴과 도깨비바늘. 하늘모르고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값을 조롱이나 하듯 농촌 폐 가옥 뜯은 썩은 서까래 부스러기. 서슬 퍼런 법조인 닮은 대나무 마른 것. 이런 잡것들로 불을 때어 봐야 연기만 많이 날 뿐 구들을 덥히기에는 역부족이다.
뭐니 뭐니 해도 시골 서민들과 친근한 솔향 그윽한 소나무가 제일이고, 입담 좋은 옆집 아저씨같이 불땀 좋은 참나무가 제일이지.
예순을 오르고 칠순을 바라보는 두 여인, 구들방이 아날로그 X-Ray 기곈줄 알고 앞판 뒤판 옆판을 돌려가며 빠짐없이 지긋이 찍는다.
몇 살 많은 언니가 한참동안 돌려 눕기를 하고 나더니 “아~ 따시다, 참 좋다!” 신음 하듯 토하는 말에 웃음이 절로 난다.
“아요! 좀 보이소. 아까 거 아궁이에 고구마 넣어 놓은 거 익었는지 함 봐 주이소.”하며 심부름을 시킨다.
“그런데, 무슨 사람들이 와 그리 시킨 대로 안 하노?
정부나 도(道)에서 몬가그로 하모 안가야지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라고 시(市)에서 제주도까지나 가겠다는 연수를 승낙 하고 보냈는가 이 말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지역에서 그 경비 쓰고 하모 어디 덧나나?” 코로나 때문에 갖가지 점포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며, 나라 안의 정세까지 어수선하니 누굴 믿고 살 것이며 무슨 재미로 지내야 할지를 앞뒤 없이 진물 나게 열변을 뿌린다.”
저녁때가 되자 작은 밥상이 자리한다. 빈약한 반찬이지만 성의는 표시 된 듯. 생수 두 잔과 소주 두 병이 합창으로 네 사람을 맞으며.
“며칠 전에 뵙고 또 뵙네요?”하고 눈짓을 한다. 윙크 받은 방문객, 흥감한 목소리로
“아하~하! 정말 반갑네요. 오늘 또 만나게 되어.” 하고는 마스크 안으로 혼잣말을 한다.
“아이구야 ~ 세상이 어떻게 될는지? 코로나 없고 일자리 많은 나라, 꼭 지켜야 할 공약은 지키는 지도자도 없고. 법 위에 권력이 올라서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외치던 때가 언젠데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깜깜이 나라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하며 밥상 옆에 앉는다. 지나가던 동갑내기 초로(初老)가 한 마디 거든다.
“그래, 이런 불평들, 국민의 작은 소리 크게 듣겠다는 위정자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들을 얕보지 마라. 그대들이 앉은 거룩한 그 자리, 각 지역 이 · 통장이면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일과 자리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며 붉게 달아 오른 얼굴로 침을 쾌액 밭으며 휙 나가버린다. 따뜻한 온돌 방안에서는 벌써 코고는 소리가 난다.
